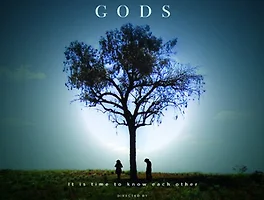<우리 선희>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홍상수 감독의 새로운 영화의 배경이 수원이란다.
매번 무슨 영화를 만드는지도 만들었는지도 모른채 마치 비디오 가게에 열편씩 나열된 신작 비디오를 발견할때처럼
습관처럼 보아오던 그의 영화인데 영화의 배경 덕택에 처음으로 기대란걸 하고 기다리게 됐다.
수원에 세번을 갔는데 간 목적은 화성이 전부였다. 수원의 시내버스까지 갈아타야 했었는데 그 울렁이는 기분도 추억이 됐다.
고궁 촬영을 즐기는 감독이니 수원에 가서 수원 화성을 지나치진 않겠지?
게다가 새로운 영화에 <우리 선희>에서 인상 깊었던 정재영이 나온다니 더더욱 기다린다.
정재영한텐 미안하지만 이 배우는 천만배우 이런거 안되고 그냥 뭔가 이런 귀여운 배우로 남았으면 좋겠다.
가끔 생각한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 자신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타지 못해 기분 나빠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는 이번에도 못 탔네', '다음번엔 정말 주연상을 탈 만한 배역을 꿰어찼군' 이라고 말하고 있는 동안
과연 그 본인도 그런 아쉬움과 고민의 시간을 보내며 칼을 갈고 있을까. 왠지 전혀 그럴것 같지 않다.
정재영 같은 배우도 조연에서 주연으로 자리매김한 비슷한 연배의 배우들을 보며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까? 그럴것 같지 않다.
그가 언젠가 남우 주연상을 타고 최고의 흥행배우가 되면 그도 토크쇼에 나와
유명한데 별다른 히트작 없었던 배우 생활에 대해 자기연민의 어조로 허심탄회 털어 놓을까. 그러지 않길 빈다.
힘들었던 시간과 서러웠던 순간을 말하며 폭풍 눈물을 흘리고 간신히 얻은 유명세에 구설수에 올라 침체기를 겪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구설수도 웃음의 재료로 써먹는 방송에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그런 스타의 삶보다는
잘되는 영화 멋있는 배역만 고르는 톱스타 보다는. 일은 취미처럼 취미는 일처럼 하는 배우의 삶이 멋있는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제프 브리지스, 잭 블랙 같은 배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난 <내 깡패같은 애인>의 정유미가 가장 좋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연애의 발견>의 정유미를 가장 기억할거다.
엉겁결에 로코퀸이라는 수식어를 가질 수도 있는 배우가 되어버린 정유미이지만
드라마에서 호응을 얻은 캐릭터도 어쩌면 홍상수의 영화에서 연기한 캐릭터의 말랑말랑한 온라인 버전에 가까워보인다.
홍상수의 영화들을 보다보면 반사적으로 이전 영화들의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을 끌여들이게 된다.
이 영화를 보면서 <옥희의 영화>나 <첩첩산중>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지만
전작인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을 떠올려보면 영화의 제목이 <누군의 여자도 아닌 선희>였었어도 어울렸겠다 싶다.
대명사라는 품사 자체가 매우 상대적이고 이중적인 의미를 함유한다고 생각해볼때
우리가 늘상 '우리'라는 테두리에 가두고 소유하고 의미를 쏟아 붓는 대상들이 사실은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매우 포괄적이고도 불분명한 대상일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선희를 통해 알게되다니.
그리고 선희라는 그 대상 자체도 누구의 소유이려고도 하지 않는 뜨뜨미지근한 자세를 취했을때의 화학작용이란.
그것은 플라스크속에서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끓어오르는 격렬한 화학반응이라기 보다는
그냥 서서히 산화하여 녹슬어가다가 결국 부식되어가는 습관적이고도 뻔한 인간관계와 비슷해보인다.
대문짝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치킨집 스티커는 그렇고 그런 뻔함이지만 그 뻔함도 로망이 되고 기다림이 된다.
불분명한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서 한방의 동사를 끄집어 내지 못해 오락가락하는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요? 음악을 틀을 까요?라고 천연덕스럽게 묻는 술집 주인 예지원은 또 어떤가.
웃음을 머금은채 손님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가장 관대한 관찰자이지만
그도 언젠가는 그 미적지근한 화학작용의 주체였단걸 누군가는 눈치챘을거다.
예지원의 얼굴에 누구의 친구도 아닌 <북촌방향>의 술집 여주인 김보경이 오버랩되는것이 억지는 아닐터.

누군가의 누군가가 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타인으로도 남고 싶지 않은 어설픈 관계.
한때 일방적인 구애도 있었고 격렬이 사랑했으며 처참하게 싸워 남이 된 순간들도 있었을지 모를 관계이지만
이들 영화에서는 늘상 그런 뜨겁고 인간적인 인간관계 대신
데워먹을까 볶아 먹을까 아니면 라면 국물에 말아먹을까 고민하게 되는 식어버린 찬밥 같은 인간관계만 즐비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해 안달난 사람 하나 없고 시작하지 못해 애 태우는 사람도 없이 리사이클되는 감정들.
어쩌면 쉽게 변할것 같지 않은 감독의 영화 스타일.
이십년동안 보아온 그의 영화들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이십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다.
<자유의 언덕> 리뷰 보러가기
<밤과 낮> 리뷰 보러가기
<북촌방향> 리뷰 보러가기
<다른 나라에서> 리뷰 보러가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리뷰 보러가기
<생활의 발견> 리뷰 보러가기
<오!수정> 리뷰 보러가기
'Film'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ong of the sea> Tomm Moore (2014) (0) | 2015.05.30 |
|---|---|
| <I Origin> Mike Cahill (2014) (0) | 2015.05.30 |
| <소년, 소녀를 만나다 Boy meets girl> Leos Carax (1984) (0) | 2015.04.02 |
| 자유의 언덕 (2014) (0) | 2015.03.22 |
| <Words with gods> 에밀 쿠스트리챠 외 8명 (2014) (0) | 2015.03.21 |
| <Only lovers left alive> Jim Jarmusch (2013) (0) | 2015.03.19 |
| <Toast> S.J Carkson (2010) (0) | 201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