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의 어드벤트 차력(티캘린더)과 2025년 친구의 작품 달력. 고맙게도 3년째 이 조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해를 맞이한다. 같은 소포 상자에 담겨있던 또 다른 친구가 전해준 동화책들. 행사에서 생긴 꽃 한 다발과 책자들, 언제나처럼 테이블 위의 잡동사니들과 함께 12월이 또 시작됐다.
11월 말에 독일 화물 수송기가 빌니우스 공항 근처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었다. 비행기 잔해 옆으로 배송되지 못한 노란 상자들이 산산이 흩어져있고 그걸 주우러 갔던 사람들은 현장에서 잡혀가고. 그 와중에 독일에서 보낸 소포가 폴란드에서 움직이질 않는다는 친구의 문자. 어쩌면 친구가 보낸 차력이 굳이 추락한 비행기에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차력을 하늘로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3일 후에 고맙게도 다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 주었다. 그래서 4일 분 차창을 한꺼번에 열고..

24일까지 달력 속의 차를 하나씩 뜯을 때에는 사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다가간다는 느낌보단 매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한해를 조용히 정리하고 작별하는 느낌에 가깝다.

나의 최초의 클리퍼티는 각이 잘 안 잡히는 수수한 재생지 상자에 담겨있던 디톡스라인 백차였다. 그 백차 상자가 약간 사찰 음식 식당 주인이 입을 법한 생활 법복 색감이랑 비슷했다. 그래서인지 그 서걱서걱한 포장을 만지면 차를 마시기도 전에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다. 17년 전 그때가 이곳에서 맞이한 첫겨울이어서 더 기억에 남는다.

다른 브랜드의 허브차 티백을 한번 짧게 우리고 건져서 새로운 물에 우린 정도의 연함이 클리퍼티이고 클리퍼티백을 건질 타이밍을 놓치고 좀 많이 우려 져서 뿌옇게 된다 싶은 맛이 대표적으로 푸카티이다. 푸카 차력도 함께 도착했는데 푸카티는 역시 강황 팔각 카다멈 이런 아이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 클리퍼차에 Cupper라고 쓰여있는 이유는 독일이나 스페인등의 국가에서 이미 클리퍼란 명칭이 사용 중이라 쓸 수 없어서라고 한다.

12월 1일의 아침을 아직은 차력 없이 커피와 함께 시작했다. 이제 12월이 되면 이런 사진 한 장은 자동적으로 찍게 된다. 이 아침 시간의 이 식탁의 빛깔과 포트와 접시가 드리운 그림자 속에 묻어나는 12월 1일의 공기가 마치 12월 1일의 나를 도리어 알아보는 것 같다.

뭉그러져가는 배가 있어서 시나몬과 졸인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썩어가는 음식은 사실 없다. 각자 더 쓸모 있는 곳이 있으니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고 꾸준히 힐끔거리며 잠시 미뤄둘 뿐이다.

반찬 몇 가지가 있어서 꺼내서 밥을 먹었다. 이름도 겨울스런 윈터 스투루델. 아이들 잔이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차력시즌이 되면 이래저래 색감이 비슷해서 꺼내보게 된다.

마른 고추대신 프릭끼누를 넣고 눈곱만큼 남은 파슬리를 썰어서 면과 섞는다. 이 고추는 맵지만 그냥 먹어도 맛있고 매운 정도에 비해서 속이 쓰리거나 하지 않아서 자주 산다. 리투아니아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수입 외국 고추들을 매운 순서대로 쓰면.. 캐롤라이나, 나가, 하바네로, 프릭끼누, 할라피뇨... 평범하고 긴 빨간 고추들도 늘 있지만 전혀 맵지 않을 때도 있어서 잘 안 사게 된다. 캐롤라이나 리퍼는 위가 아파서 잠에서 깰 정도로 맵다. 하바네로에 비해 괴팍하게 쭈글쭈글한 이 고추는 정말 고추를 먹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잠결에 믿게 해 줬다. 이 캐롤라이나 리퍼, 나가 바이퍼, 하바네로 같은 징한 고추들을 모둠 매운 고추로 포장해서 이곳 마트에 판다는 게 신기할 뿐이다.

전날 마늘 파스타 해먹은 팬에 마늘과 기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빵을 토스트 해서 먹었다. 프라이팬과 청바지는 가능한 한 씻지도 빨지도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팬을 음식으로 닦으며 계속 쓸 수 있는 뭔가를 하는 편이다... 그렇게 만든 토스트는 맛있고.. 후줄근한 청바지는 편하고..

전날 그 전날 그 전전날 먹다 남은 이것저것을 곁들여서 저녁... 이 차력에는 라즈베리, 딸기, 히비스커스가 베이스인 과일차들이 좀 있었다.

동네 카페에서 빵 하나를 사 와서 차를 세팅하고 커피를 우선 내렸다.

이번 12월은 오전 중에 일이 많아서 오후가 돼서야 차를 마시는 일이 많았다. 12월이 그렇듯 오후 네시만 돼도 밤이고 오전이라 해도 뭐 딱히 밝지는 않다. 아침 먹는 걸 좋아하지만 아침에 아침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땐 저녁을 아침처럼 먹으면 된다.

클리퍼에서 나오는 차종이 꽤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차력을 빌미로 다른 차를 광고하겠다는 건설적인 생각을 딱히 안 했다. 그래서 굳이 다른 라인의 차들을 섞지 않고 허브차 위주로 어떤 차는 2번, 3번까지 반복해서 집어넣었다. 이런 빡쌔지 못함이 또 그런대로 마음에 들었다. 집에 있는 다른 클리퍼차와 함께 섞어서 티타임.

붉고 투명한 차가 맛있어 보였는지 같이 마시고 싶다고 하여 이 컵에서 저 컵으로 뒤늦게 티백을 이민시키며 우린다. 너무 정확하게 붉은빛이 나는 차들에는 뭔가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잔망스러움이 있다. 특히 히비스커스는 실수로 잘못 떨어뜨려진 페놀프탈레인 용액 한 방울에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비커 속의 지시약 같은 느낌이다.. 히비스커스는 죄가 없지만 미안해.

줄기가 매달려있는 작은 당근이 마트에 항상 있는 게 아니라서 등장하면 일단 산다. 때마침 집에 크림이 있으면 더 좋다. 냉장고에 식재료가 다양하게 많으면 확실히 이것저것 조합해서 해 먹을 게 많을 것도 같지만 결국 냉장고가 비교적 비어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전날 먹은 줄기콩이 반쯤 남아있던 팬에 다시 기름을 퍼붓고 달걀을 풀어 넣어 먹는 아침.

두 종류의 터머릭 티와 카페의 시나몬 롤을 사서 티타임. 이 클리퍼의 오렌지 터머릭 티가 맛있다.

빌니우스에는 스콘 파는 곳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동네 빵집에서 체다치즈 스콘을 팔아서 만들기 귀찮을 땐 간혹 사러 간다. 불 끄고 뚜껑 덮고 달걀흰자 익히면서 팬 귀퉁이에 착석시키면 대략 알맞게 데워진다.

12월의 전용 소리들이 있다. 여름에 얼려둔 레드 커런트를 꺼내서 접시에 옮겨 담을 때 또르르 구르는 소리. 90년대의 젊은 엄마가 부업으로 큰돈을 벌겠다며 큰 비닐봉지에 바리바리 담아왔던 각양각색의 구슬들이 실수로 쏟아져 장판 위를 굴러 장롱 아래로 들어갈 때 나는 소리와 유사하다. 그리고 그 커런트를 꿀과 시럽에 좀 휘저은 다음 찬기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씹는 느낌도 나름 12월 느낌이다. 7월에도 커런트를 사서 냉동실에 넣을 수 있지만 7월에는 7월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으니깐.

버섯 먹을 때마다 느끼지만... 그냥 볶기만 해도 자신이 맛있는 존재라는 것을 버섯은 알까. 버섯이 그걸 알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건 나의 오만이자 착각일지도 모르겠다. 버섯은 숲 속에서 가을 낙엽에 뒤덮여 그냥 조용히 썩어가고 싶어 하는지도.
또다시 등장한 윈터 스트루델은 버섯에 섞인 시금치와도 사박사박거리는 숲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 단연 이번 차력의 앰버서더로 임명...

기본적으로 이 차력에선 오렌지와 레몬이 그려져 있는 차들이 맛있다. 좀 더 달게 마시려고 모과청도 곁들였다.

노른자가 잔뜩 들어간 케익을 굽고. 남은 흰자로는 대왕 프라이를 하고. 크리스마스 휴가 이동 전 아침을 먹는다.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이 버스 여행은 정말 편해졌다. 바르샤바 가는 새벽 버스가 나에게 절대적인 휴식을 제공하듯 냉장고를 비우고 선물을 꾸려서 12월 파네베지행 버스를 타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확 풀어진다.

그렇게 티백 몇 개와 바클라바 한판을 만들어서 파네베지에 왔다. 12월이 다른 달 보다 분주한 이유 중 하나는 1년에 한 번 하는 어떤 것들을 12월에 보통 하기 때문이다. 바클라브 만드는 것도 일종의 그런 일이다.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 부풀리고 거품 내는 것들에 비하면 비교적 단순하다. 하지만 하려고 마음먹기 힘든 것들, 왠지 아주 '간혹' 해야만 좋은 것들이 있다. 모든 좋은 순간은 극도로 짧고 그 여운은 길다. 그래도 바클라바는 크리스마스 연휴 내내 먹었으니 좋은 순간의 지속력이 꽤나 길었던 편이다.

투명 카프카 머그 속 백차가 은은하고 바클라바와도 잘 어울린다. 바클라바는 줄어가지만 아쉽지 않을 만큼 먹었고 그렇다고 질리지도 않았다. 파네베지엔 카프카와 우디알렌, 카카오 프렌즈의 네오가 부엌에 산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카프카 원작 연극을 두 편이나 보았다.

리투아니아 계란 과자 샤코티스 들고 빌니우스로 돌아왔다. 명절 보내고 빌니우스에 돌아오니 역시 먹을게 전혀 없다.

저물어가는 12월의 한 끼. 크리스마스 겸해서 새해 첫 주까지는 2주간 겨울 방학이다. 짧은 방학은 나도 방학하는 것 같아서 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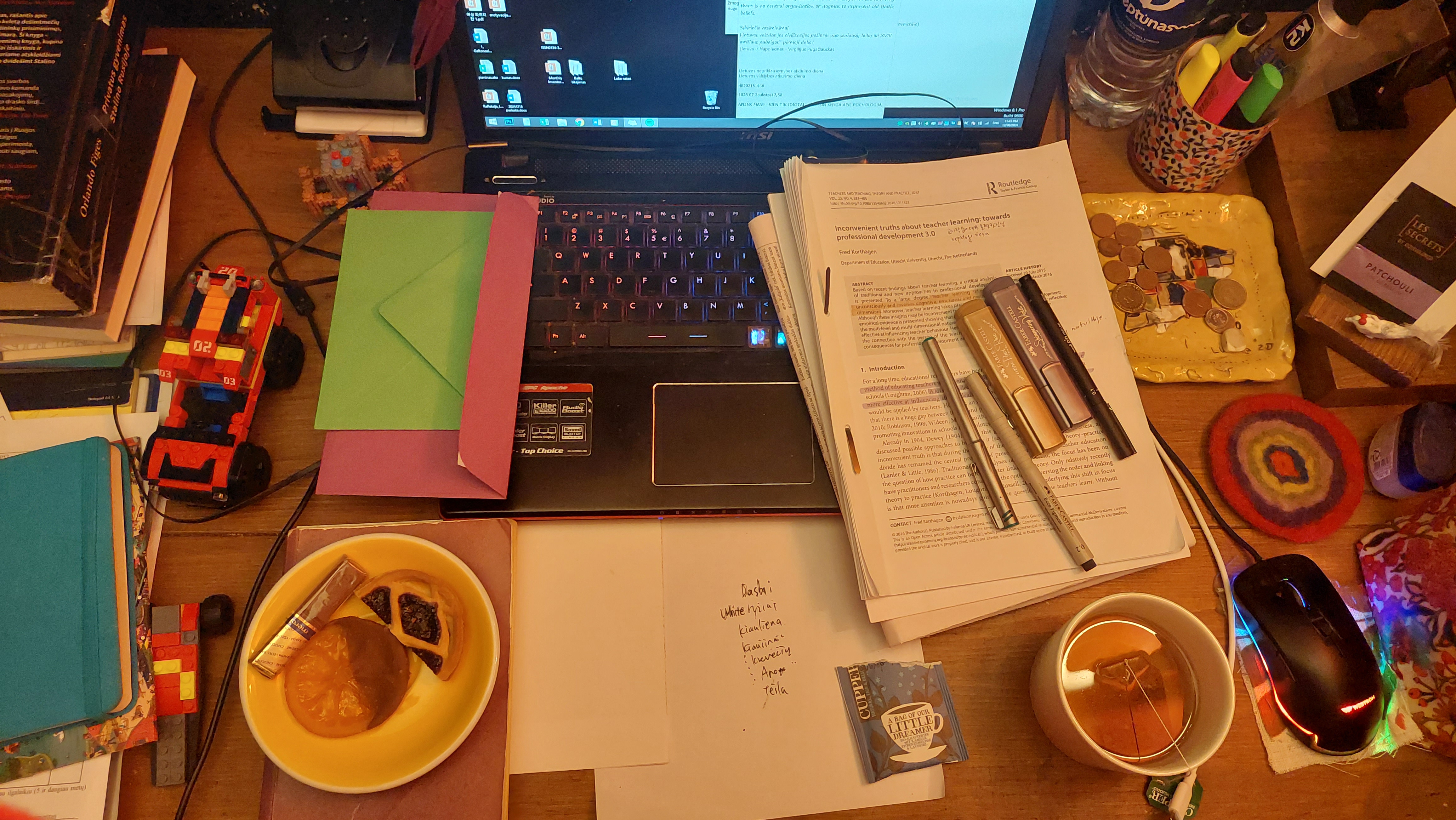
자정이 되어가는 시간에 마지막 남은 차를 끓이고 달짝지근한 것들을 대동하고 컴퓨터 전원을 누른다. 하루를 12개월로 나눈다면 아마 이 시간이 나에겐 12월 하순쯤이 아닐까 싶다. 찌뿌둥했던 4월의 아침도 화사한 6월 정오도 복작복작했던 11월 저녁도 이미 전부 지나온 순간. 살아있다면 애써 기다리지 않아도 늘 정확한 시간에 제 발로 나타나는 고마운 순간이다.
내 경우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로 남을 때 그 결정타는 사운드트랙이 날린다. '아... 이 영화 정말 잘 만들었다. 평생 볼 수 있어.. 평생 친구야'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에선 늘 결정적인 음악이 흘러서 그 생각을 굳힌다. 그러니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화면 앞에 나를 붙잡아 둔 다면 좋은 영화이다. 스페이스 바에 검지를 올리고 크레딧속에 횡렬종대된 사운드트랙 리스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일테니 말이다.
그러니 어쩌면 이렇게 차와 함께 차에 대한 짤막한 기록을 남기는 이 순간은 영화가 끝난 후 크레딧 속의 사운드트랙을 포착하는 순간과 흡사하다. 지난 시간의 즐거웠던 장면, 감동적이었던 순간, 화가 났던 장면, 눈물이 나기도 했던 순간들이 차례대로 스쳐 지나가고 좋은 음악들은 늘 마음속에 있으니 들으려고만 하면 언제나 흘러나온다.
무사히 지나가줘서 고마운 2024년. 차력도 고맙다.
'Dai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난 일요일의 리가 (3) | 2024.10.06 |
|---|---|
| 지난 시즌의 테킬라. (4) | 2024.01.23 |
| 2023년 12월의 반려차들 (4) | 2024.01.03 |
| 늦여름의 노란 자두 (4) | 2023.10.01 |
| 빌니우스의 테이글라흐 (5) | 2023.06.01 |
| 부활절 지나고 먹은 파스타 회상, 컨트롤, 조이 디비젼. (5) | 2023.05.06 |
| 도서관에서 차 한 잔 (3) | 2023.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