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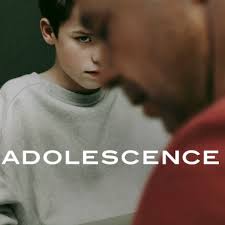
영화 포스터에 혹해서 보게 된 덴마크 영화 <Sons>. 이 영화의 포스터 구성이 묘하게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 Adolescence>과 비슷하다. 그리고 13살 소년 제이미의 미래를 그려보는 순간 <Sons> 속 미켈의 모습이 겹쳐지며 조금 암담했다. 포스터만 봐도 두 작품 속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포커싱 된 표정과 흐릿한 표정을 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직면하는 각기 다른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본다.
영화는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는 덴마크 여성 에바(Sidse Badett Knudsen)의 이야기이다. 에바의 직장에는 둔중한 감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식판이 놓이고 수거되는 소리, 수갑이 채워지고 풀리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소리만이 가득하다.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오고 간다. 따스한 대화도 가벼운 농담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있다고 해도 그것에서 진심을 읽어내긴 쉽지 않다. 에바의 표정도 항상 어둡고 경직돼 있다.
교도관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는 어떨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직업이야말로 하루속히 인공지능이 대체해야 할 직업이 아닌가 아주 잠깐 생각했다가 사회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교화 내지 격리시킨다는 목적으로 모아놓은 또 다른 형태의 사회에서 수감자들에게 그나마의 인간과의 교감도 빼앗아버리면 그것은 정말 비인간적인 처사 일까로 생각이 옮겨갔다. 그럼 수감자와 교도관 사이에서 생겨나는 감정을 교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심과 혐오, 폭력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잔뜩 축적된 '감옥'같은 공간에서 과연 진심으로 서로 교감한다는 것은 가능할까.
에바는 수감자들에게 간단한 연산을 가르치고 명상수업도 이끄는 등 평범한 직장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던 중 새로 입소하는 수감자 사이에서 아들의 살해범 미켈(Sebastian Bull)을 발견하고 윤리적으로 애매한 입장에 놓이며 동요하기 시작한다. 에바는 결국 상관을 찾아가서 근무 장소를 바꿔달라고 부탁한다. 아들의 살해범이 같은 교도소에 있으니 그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에바는 미켈이 속해있는 강력범 수감 시설로 자발적으로 출근한다. 물론 그 사실은 에바만이 안다.
초반에 에바는 미켈의 샌드위치를 열어 침을 뱉거나 미켈에게 배정된 담배를 주지 않는 등의 유치한 방식으로 미켈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런 작은 괴롭힘에도 처절하게 무너질 만큼 미켈이 자기 통제력이 전무한 인물일 거라는 걸 에바는 이미 안다. 아마 대부분의 위험한 수감자들이 그럴 것이고 그런 특성이 그들을 감옥이라는 곳으로 이끌었을 거다.
에바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눈치챈 미켈은 식사배급을 위해 감방문을 여는 에바에게 오물을 투척하고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에바의 괴롭힘은 점차 대담해진다. 에바는 미켈의 감방에 몰래 금지 약물을 숨겨놓고 감방 수색에 걸린 미켈은 독방에 갇힌다. 정당방위를 가장하며 에바가 휘두른 곤봉에 미켈은 큰 부상을 입기에 이른다.
아들을 잃은 에바와 감옥에서 조차 고립된 미켈은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 보인다. 에바의 마음이 조금은 약해졌고 흔들리고 있음이 눈에 보인다. 결국 이전 근무지로 되돌아가겠다는 에바에게 미켈은 자신의 교도관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수감자 학대 행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한다.
미켈은 에바의 괴롭힘을 일종의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그와의 갈등을 극복하며 오히려 감옥생활에 적응해 가는 중이었고 어쩌면 남성 교도관보다는 엄마 같은 에바에게 의지하며 편안함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에바는 하루 외출을 얻어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들은 미켈의 엄마를 방문하러 감옥 밖으로 나선다.
에바는 아들을 잃은 엄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의 아들 역시 범죄자였다. 그리고 아들은 감옥 속에서 미켈에게 폭행을 당해 죽는다. 에바는 교도소를 방문한 신부에게 항상 아들을 대하기 힘들었고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땐 더 이상 아들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자유를 느꼈다고 고백한다. 단 한 번도 아들을 면회한 적이 없는 에바는 미켈을 면회 오는 그의 엄마를 면회실 창문 너머로 지켜본다. 그 짧은 순간 아직은 아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엄마를 향한 부러움과 자신의 아들을 돌보지 못한 죄책감이 교차한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자유롭지 못한 감옥이라는 공간이라고 해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엄마를 만날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증오감이 솟구친다.
엄마를 방문하고 교도소로 돌아가는 도중 에바가 피해자의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미켈은 숲으로 도망친다. 자신도 어쩌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버텨오던 시간들은 미켈이 늘 가지고 있었을 죽은 시몬(에바의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이제 정말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 직면하면서 재가 된다.
에바는 숲에서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은 미켈을 눌러 질식시키려다 관둔다. 그것이 미켈을 용서한 것인지 그저 인간으로 남기 위한 에바의 도덕적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제 와서 저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푸념하는 교도관들의 대화는 소심한 복수와 징벌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라는 형벌이 범죄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게 할 거라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 아니냐고 되묻는다.
덴마크에는 사형제도가 없단다. 나는 사형제도에는 반대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피의자에게 약한 처벌이라고 분노하는 것을 볼 땐 잠시 갈등한다. 죽음은 과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지 누군가가 그런 형벌을 받는 것으로 과연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고 사회 정의가 회복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단순히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은 생각만큼 큰 형벌이 아닌 걸까.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면 단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보존되는 것이라면 그를 인간답게 만드는 그 마지막 요소를 가차 없이 없애버리는 것만이 결국 유일한 형벌인 걸까.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처벌한다는 발상 자체는 정당한걸까.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는 한 건지. 뉘우치는 중이라는 죄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이 강한 지도 묻게 된다.
영화를 보면서 어떤 아들과 엄마들이 떠올랐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남자가 그 죄를 뉘우쳤고 용서받았다고 말하자 어떻게 그 죄가 없어지냐며 오열하는 <밀양>의 전도연과 물에 빠진 동네아이를 구하고 죽은 아들의 기일이 되면 매년 제사상 앞에 살아남은 아이와 가족을 불러다 세워놓는 <걸어도 걸어도>의 키린 키키까지. 그들의 모습이 아들을 잃은 교도관 에바의 얼굴 위로 묘하게 중첩됐다
<Sons>는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넘어서, 죄와 벌, 용서와 변화, 인간성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에바를 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를 여전히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일이라 생각했다. 남겨진 이들이 겪는 고통과 기억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말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일까.
'Film' 카테고리의 다른 글
| Beautiful city (2004) (0) | 2025.09.08 |
|---|---|
| Dancing in the Dust (2003) (3) | 2025.09.01 |
| Nightbitch (2024) (0) | 2025.06.21 |
| 라 코치나 (La Cocina, 2024) (0) | 2025.03.31 |
| The Price of milk (2000) (0) | 2025.03.28 |
| Rams (2015) - 아이슬란드의 양(羊)영화 (0) | 2025.03.26 |
| The cow (1968) (0) | 2025.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