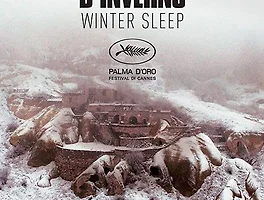개인적으로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술 특히나 와인에 관한 영화들은 보통 재밌다. 음식 영화도 그렇고 어떤 요소들이 이런 영화들이 재밌고 유쾌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상처받을 걱정없이 어떤 대상을 마음껏 찬양하며 일방적인 애정을 쏟아내는 주인공들과 그 대상을 통해 그들이 위안받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흠뻑 빠져서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나 역시 그럴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진다. 물론 대화 속에서 어느정도 공통분모를 찾을때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자마자 떠오른 것은 단연 영화 사이드웨이 (https://ashland11.com/90)이다. 사이드웨이를 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감독과 제작자가 자기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고 있는 제라르 드파르디유를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가, 그러니깐 와인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우리 프랑스인이 저기 미국인들이 만든 저 사이드웨이를 능가할 영화 한 편 정도는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제라르 드빠르디유의 포도농장 앞에서 삼고초려해서 만든 영화 같다. 실제 와인광이며 세계 각지에 와인농장이 있다는 제라르 드 빠디유. 사실 화려한 그의 필모가 무색하게 그의 영화를 그다지 많이 보진 못했지만 앤디 맥도웰과 출연한 <그린 카드>와 그 영화 속의 조지를 난 너무나 좋아하므로 일흔을 넘긴 그리고 예전과 똑같이 생긴 코를 지닌 거구의 그를 마주하고 있자니 뭔가 반가운 마음과 함께 쓸쓸함도 몰려온다. 나 역시 그린 카드를 처음 보았을때를 생각하면 똑같이 25년 더 나이든 것인데 유독 타인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서 회한을 느끼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다. 사이드 웨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남자들의 수다가 주를 이루는 로드무비이다. 다른것이 있다면 세대가 다른 남자 세명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 이들도 이동 중 늘상 와인을 마시고 어떤 여인들과 조우한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프랑스판 사이드 웨이라고 말할 수 있을만큼 예민하고 감성적인가 하면 또 그렇진 않다. 화질탓이었는지 카메라 사용 방식때문이었는지 심지어 아주 공들여 만든 흔적도 없다. 그냥 영화 촬영을 핑계로 와인 여행을 떠난 느낌이다. 와인에 관한 과한 담론으로 있는척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사이드웨이를 향해 코웃음이라도 치는듯 '무슨 개똥철학이니. 우린 그냥 마신다 이 미국인들아.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것도 같다. 함께 여행을 하게 된 젊은 택시 기사가 mike 라고 소개하자 '뭐 마이크? 미케? 그거 미국이름 아니야? 이름이 마이크래. 키득키득. 뭐야.' 라고 보는 사람도 민망할 정도로 웃어제낀다.
내 할아버지뻘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젊고 아들로 나온 이 배우는 또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 들어보여서 상대적으로 제라르 드빠르디유가 더 나이 든 것처럼 느껴졌다. 평생 소를 기르는데 헌신한 아버지 장. 하지만 아들 브루노는 가업을 물려받기가 싫다. 뭔가 지긋지긋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그들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가축 박람회(?)에 참여중인 아버지는 아들과의 대화가 절실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피해다니며 박람회장 곳곳의 와인 농장 부스에서 취할 정도로 와인 시음에 열중한다. 아버지와 아들간의 좁힐 수 없는 차이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려나 했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다. 그들은 택시 뒷자석에 나란히 앉아서 여행을 떠난다. 그들은 즉흥적이다. 서로에게 초연하다. 사사껀껀 충돌해도 서로에게 삐지지 않는 느낌이랄까.
장은 틈만나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넨다. 주가 되는 것은 하나뿐인 아들 브루노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먼저 세상을 뜬 아내 전화기의 자동응답기이다. 우연히 화장실에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아들 브루노는 그 사이 새 여자가 생겼냐며 아버지를 비난한다. 장은 말없이 아내의 전화번호를 눌러 아들의 귀에 가져다 댄다. 그 뒤로 택시 안에서 장과 브루노는 키득거리며 엄마의 자동 응답기에 메세지를 남긴다. 장은 한밤중에 숙소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지만 전화기의 용량이 꽉차있어서 더 이상 메세지를 남길 수 없게 된다. 뭉클했다. 한편으로는 청승맞은 설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무뚝뚝하고 투박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영화에서 오히려 아내와 엄마의 빈 자리를 느끼며 서로의 결핍에 공감하는 주인공들의 진심이 느껴졌다. 사진은 장이 명품 소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나와 수상소감을 말하는 장면. 저 소를 끌고 인파 사이를 무덤덤하게 행진하는 그의 모습이 혹은 제라르 드빠르디유의 모습에서 바쁘고 고된 인생을 살아 온 자의 깊은 안도감, 그들이 비로소 획득한 자유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실제로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낸 제라르 드빠르디유의 개인사가 겹쳐져서인지 아들을 쳐다보는 눈빛과 공들여 키운 소의 고삐를 꽉 잡고 있는 그의 모습이 더 절실해보이는 것도 있었다. 나쵸 두 봉지를 먹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는 사이드 웨이 속의 세련된 농담이 더 좋지만 나쵸를 먹으면서 봐야한다면 이 영화를 한 번 더 볼 것 같다.
'Film'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tockholm (2018) (0) | 2019.12.12 |
|---|---|
| Arctic (2018) (0) | 2019.12.04 |
| Le Havre (2011) (0) | 2019.12.03 |
| A Better life (2011) (0) | 2019.11.11 |
| Winter sleep (2014) (0) | 2019.11.10 |
| Greenberg (2010) (0) | 2019.11.08 |
| Green book (2018) (2) | 2019.08.13 |